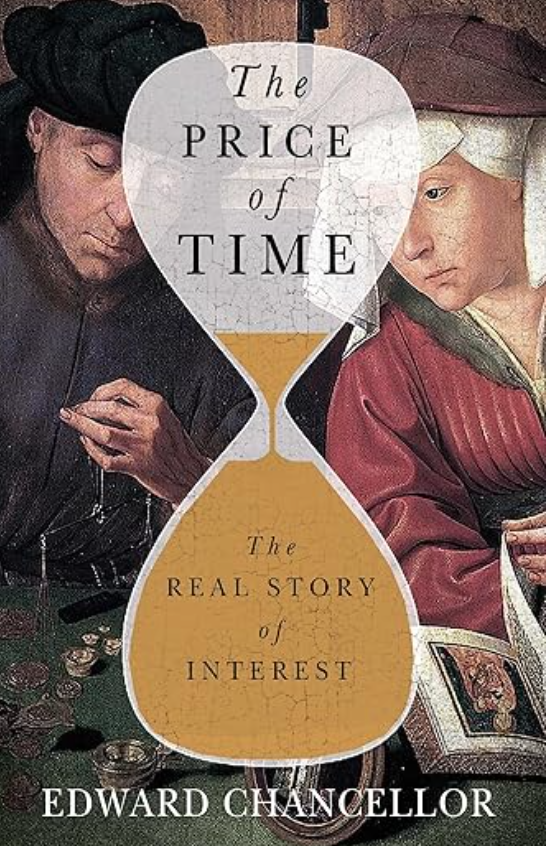
Edward Chancellor는 영국(British)의 가장 유명한 financial historian[金融史家(금융사가)], financial journalist(금융전문기자)이며 전 헤지펀드의 투자전략가 그리고 전 투자은행가라고 위키피디아는 소개하고 있다.
原題(원제)는 The Price of Time: The Real Story of Interest이고'금리의 역습'이란 제목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처음 책장을 열고 읽기 시작했을 때 단순히, 이자란 무엇인가?하는 등의 일종의 경제사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수메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고대 사회부터 이자란 개념이 있었고 왕성하게 신용경제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식의 淵源(연원)을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저금리와 양적완화와 같은 연준의 통화정책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21세기 통화정책에 대해서 하이에크의 입장에서 케인즈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저금리 정책에 대한 비판은 수단이고 본질적으로 케인즈 경제학, 경제철학에 대한 비판으로 씌어진 느낌이다.
칼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부르조아 자본주의 경제의 폭력성은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출현에 의해 상당히 순화된다. 소위, 유럽 사회의 사회민주주의, 미국의 뉴딜이라 불리는 수정자본주의의 政體(정체)는 소비에트 혁명이후 공산주의의 도전에 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응전의 산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스탈린 시절의 대숙청, 그리고 마오 시절의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으로 나타나는 사회주의의 급진성과 미숙함은 이상적 공산주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무엇보다 그 매력을 크게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상주의가 인간의 이성에 대한 설득이라면 ‘매력’은 인간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 호소일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인간에 대한 영향력은 더 커보인다.
20세기 말 소련의 붕괴와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은 공산주의의 실패라고 널리 인식되고, 이것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가속 페달이 되었을 것이다. 맨처음 사회주의 혁명의 급진성에 상당히 쫄아 있던 자본가계급은 혁명 대신 사회민주주의란 타협안에 동의하게 된다. 하지만,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현실의 사회주의의 문제점과 모순을 발견하자마자 그 틈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공략하는 대담함을 보인다. 이런 배경 하에서, 신자유주의의 확산 과정을 설명하는 자카리 카터(Zachary D Carter)가 쓴 “존 메이나드 케인즈”(The Price of Peace:Money, Democracy, and the Life of John Maynard Keynes)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자카리 카터는 신자유주의 출현을 일종의 역사적 반동으로 보는 관점이다. 같은 문제(21세기 선진경제에서 보이는 빈부의 격차와 사회적 분열,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쇠퇴)에 대해 이렇게 서로 다른 해석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다.
에드워드 챈슬러는 마르크스가 아니라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경제이론 또는 경제학을 대비 또는 대립시킨다. 그리고 하이에크 입장에 서서 현대 경제의 통화, 재정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서양철학사의 관점에서 이 두가지 이론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소위 목적론(Teleology)과 생성론적(Ontology) 세계관은 이 우주와 인간 역사의 전개과정을 에드워드 챈슬러와 자카리 카터처럼 서로 상반되는 관점에서 관찰해 왔다. 거시경제학의 이같이 서로 상반되는 대립에서 한걸음 물러나, 말 그대로 巨視的(거시적) 입장에서 바라 본다면, 즉, 세계와 우주를 바라 보는 고대로부터의 상이한 두 시각의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근시안적myopic으로 현재의 찰나를 사는 우리(그게 아니라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런 觀照(관조)의 여유가 없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주의'는 전근대의 구속과 속박으로 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근대라는 새로운 인간 역사의 지평을 열게 해 준 복음gospel이었음에 틀림 없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내고 그 혁신의 결과 발생한 불평등과 불균등이 고착화되면 더 이상의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의 자본주의는 수정이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해진다.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혼합경제가 필요한 것이다.
자카리 카터의 책, The Price of Peace와 에드워드 챈슬러의 책, ‘The Price of Time’이라는 두 개의 같은 ‘가치Price’를 말하지만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의미와 세계관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로웠다. 나는 기본적으로 케인즈의 입장을 옹호하는 편인 것 같다. 이 책을 끝까지 읽는 내내 그 불편함을 숨길 수가 없었다. 부분적으로 에드워드 챈슬러의 비판과 지적질은 귀담아 들을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스스로 위안도 해 보았지만 거의 소용이 없는 일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책을 끝까지 읽고 완전히 덮을 때까지 좌불안석이었다.
‘아시아의 힘’ 그리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근대화’의 성공 요인을 모두 산업화 이전 농업부분에서의 토지개혁과 같은 혁신, 창조적 파괴에서 찾고 있다. 산업화가 시작되기 위한 보다 평등한 출발 조건들을 갖춘 사회 즉, 다시 말해 창조적 파괴가 가능한, 혁신이 가능한 조건들은 보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가능했고 그것이 바이럴처럼 민주화된 사회로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슘페터 역시 하이에크의 동료였다. 에드워드 챈슬러는 슘페터의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란 개념이 다윈의 진화론, 적자생존 개념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자율이 그런 자연선택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 열등한 것들, 다시 말해 경쟁력 없는 산업, 좀비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전경제학의 시장 만능주의가 전부라고 한다면 산업혁명을 기폭제로 한 근대사회의 출현 자체가 모두 부정되어야만 할 것이다.
계몽사상에 기반한 근대 과학의 성취는 자연에 대한 대한 인위적 조작manipulation을 통해 생산력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자연선택에만 맡겼다고 한다면 근대사회의 출현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인간 문명은 자연에 대한 인위적Artificial 工作(공작)의 결과물이다. 고전 경제학이 말하는 Laissez-faire와 같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에만 의탁하게 되면 그 최종 결과는 록펠러의 독점, 카네기의 독점이란 사실이 역사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완전한 자유주의적 경쟁의 최종 결과물은 독점, 완전한 약육강식, 카스트 생태계의 구현이다.
통화정책이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엘리트 계급, 이들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대중매체의 선전과 선동에 춤추는 대중들의 변덕과 근시안은 이미 처음부터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
연준의 통화정책이 문제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1999년 빌 클린턴 시절에 Banking Act of 1933 (Glass-Steagall)가 철폐된다. 이는 대공황 이후 만들어진 은행의 방만한 투자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였다. 2000년의 닷컴 버블이 있었다. 2001년에 중국의 WTO가입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결정들이 리먼 쇼크를 불러 온 직접적 원인이라고 봐야만 할 것이다. 냉전의 해체를 전후로 한 일련의 신자유적 정책결정이 근본적 원인이며 연준의 통화정책은 그 서브 프라임 정책Sub-Prime Policy였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냉전적 세계질서가 해체되는 과정은 분명 새로운 세계사적 潮流(조류)가 형성되는 시점이었다. 미국의 위정자들은 당연히 승리에 취하고 의기양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 단독의 세계질서를 구상하는 데 아무런 주저, 꺼리낌이 없었을 것이다.
근대사회를 규정하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다소 상반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치관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 것처럼 보인다.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 정치의 Art적 기능이 아닐까 하는 바램을 적어 본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징키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0) | 2023.11.22 |
|---|---|
| 너무 재밌어서 잠 못드는 해적의 세계사 (1) | 2023.11.15 |
| 천재지변의 지구과학(天變地異의 地球學) (0) | 2023.11.05 |
|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Why Nations Fail? (2) | 2023.10.28 |
| 북극해, 세계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1) | 2023.1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