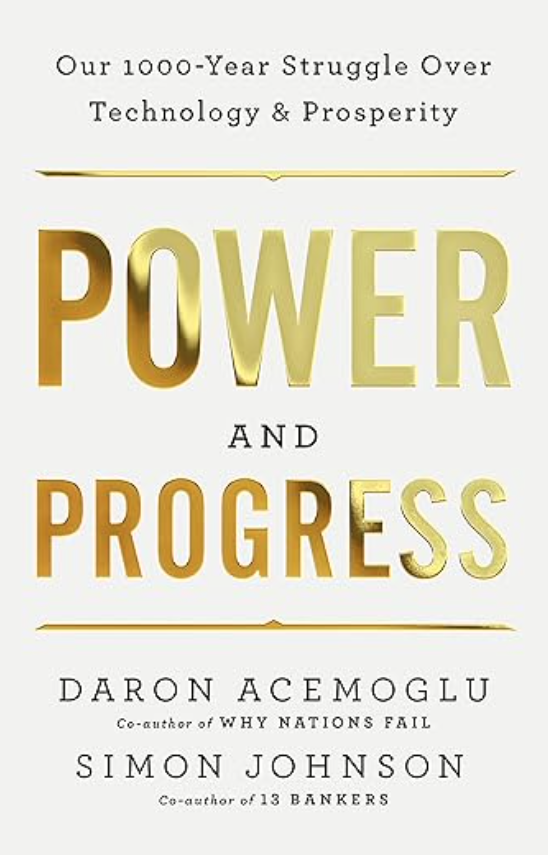
Kamer Daron Acemoğlu는 터키에서 아르메니안 가정에서 태어나 런던의 정경대학을 거쳐 미국 MIT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폴 크루그먼, 맨 큐와 함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위키피디아는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규제된 시장경제regulated market economy를 신봉하는 중도파 경제학자로서 정치적 이슈,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정치 문제에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한다. 공저자 사이먼 역시 영국출신의 미국 경제학자로 MIT에서 가르치고 있다.
특히, Acemoğlu 교수의 눈부신 역작, "국가는 왜 멸망하는가? Why nations fail?"를 읽은 독자들이라면 이 새로운 신간에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제1장
냉전의 해체 이후 세계는 世界化(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제3세계 국가의 발전이 있었던 반면, 선진국 내부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깊어져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 책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과실이 소수의 테크 기업의 오너와 경영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분배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은 수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지만 나름의 대안, 구체적 Agenda를 제시하는 것(마지막 11부)은 이 책이 가지는 차별화되는 특징 같다.
저자들은 ‘기술의 발전’이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 시선으로만 바라 본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현재 미국, 유럽과 같은 서구사회가 누리고 있었던 풍요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득권 또는 지배세력에 대한 한 투쟁의 산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킨다. 때문에 이 책의 방향은 지난 세기들의 역사적 투쟁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자들과 지배 엘리트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평등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집중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Technologies은 로봇,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대세를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0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빅테크 기업, 구글, 페이스 북과 같은 회사들이 ‘광고’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査察(사찰)을 심화[쇼샤나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of Capitalism를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시키면서 사회의 극단적 편향들을 조장 시키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전개 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고 있으며 중산층,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Productivity Bandwag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즉 신기술, 새로운 기계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생산방식이 落水(낙수;trickle-down)효과처럼 노동자의 임금에도 반영이 되는 자본과 노동의 동시적인 限界(한계)생산성의 증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술의 발전은 바로 “생산성 밴드웨건”에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함께 탑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 설득력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은 ‘설득력’과 ‘아젠다’의 설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 역시 기본적으로 부자들과 지배 엘리트들은 ‘설득’과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강점은 그들이 항상 승리자일 수 없다는데 있다. 때로, 그들의 이기심, 탐욕, 그리고 오만이 역사의 물길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Lesseps이 파나마 운하의 건설에 실패하고 파산했던 사례,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부가 제조업과 금융 중심의 산업발전 모델 대신에 흑인 노예노동에 기반한 플랜테이션 농업 구조에 집착했던 사례 등을 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기술 발전 방향을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5장, Middling sort of Revolution
영국이 어떤 이유로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힌다. 제러미 다이아 몬드가 이야기 하듯 지리적 조건이 유일하게 영국만을 콕 집어서 산업화에 유리한 것도 아니었고 니얼 퍼거슨이 말하 듯 1688년 명예혁명과 함께 네델란드에서 선진 금융시장을 벤치 마킹한 것이 영국의 특장점도 아니었다. 또 제도적으로 탁월한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이 부분에 대해서, 즉, 영국의 "산업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국가는 왜 멸망하는가?"를 꼭 읽어보기를 강력히 추천한다.)
저자들은 1차적으로 영국에는 중세에 흑사병의 창궐 이후 농촌의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노동임금가 상당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자본 축적이 가능해졌던 점. 둘째는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 수도원이 갖고 있던 영국 전체 토지의 1/4가량을 몰수한 일종의 ‘토지개혁’으로 수혜를 입은 탄탄한 중산층의 형성이 영국이 프랑스, 네델란드와 같은 경쟁 국가들에 앞섰던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19세 후반이 되면 이들 중산층들이 모험적 기업가 정신과 기술적 혁신과 함께 신분 상승의 열망으로 새로운 혁신들을 만들어 내고 귀족들과 같은 기존의 지배계급은 이들 혁신가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그 과실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태도를 성공 요인으로 본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대부분 이들 중산층 출신들이 주도했다.
Edwin Chadwick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을 공중보건행정의 창시자다. 이 사람은 도시에 하수도라는 개념을 처음 적용, 오늘날과 같이 메가시티가 가능하게 만드는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제러미 밴담의 추종자, 존 스튜어트 밀 등과 교분, The Poor Law의 개정을 이끌었다.
19세기 전반기, 초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면직물 산업에서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석탄 산업에 있어서 아동노동, 공중보건 개념 없이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의 열악한 환경 등은 철도 산업이 등장하면서 상당부분 해소되기 시작한다.
제7장
2차 대전 이후의 30년을 프랑스에서는 ‘영광의 30년’이라고 언급하는데 이 시기 서구사회는 전례 없이 풍요로운 시기를 경험했다. 이런 풍요의 시기는 두 개의 축으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자동화를 통한 비용 감소와, 노동자들의 교섭력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후발 주자였던 스웨덴의 사례를 예시한다.
대공황 이후의 스웨덴의 선택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차별화 된다. 그것은 스웨덴의 상대적 후진성 때문에 생긴 기회였다. 스웨덴 개혁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정치세력은 SAP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였는데 집권을 위해서 농촌 노동자들과 중산층으로의 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마르크시즘으로부터 수정 노선을 택한다.
대공황의 시작이 시작되자 SAP는 대규모 재정지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임금 인상 그리고 금본위 탈퇴를 통한 재정확대 등의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자본과 노동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공유, 세제를 통한 재분배 정책, 사회적 보험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합 헌법 개혁Institutional leg을 강하게 밀어 붙인다.
여기서 다시금 케인즈 경제학의 공로와 기여를 실감하게 된다.
제8장 Digital Damaged
1970년 뉴욕 매거진에 실린 짧은 에세이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프리드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한다. 즉,사업의 “사회적 책임”은 잘못 해석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 및 주주이익의 극대화다.”고 선언한 이후 비즈니스는 반노동, 반정부규제의 방향이 하나의 사회적 준칙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초기 디지털 해커들의 비전은 비트코인과 같이 반집중, 탈중앙이었지만 현실은 탑다운 방식의 소프트 웨어로 자동화, 노동통제의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불평등의 심화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디지털 유토피아’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제조업 일자리 상실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디지털 기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세계화와 서플라이 체인와 오히려 더 인과관계가 깊은 것이 아닐까 싶지만 결과적으로 세계화와 자동화는 동시에 시너지를 내면서 노동비용을 감소시킨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대항력 그리고 정부규제의 힘은 확실히 1980년대부터 약화되었다고 한다.
세계화와 자동화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노동권과 정치적 결집력의 약화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과 함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도 불평등 구조도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제1세계와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달라 보인다.
“stock option”과 같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칩워’의 입장은 ‘권력과 진보’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프리드먼 독트린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곳은 ‘경영대학원’이라 일컬어지는 '비즈니스 스쿨’이다. 1970년대부터 전문 경영인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비즈니스 출신 전문경영인은 1980년대 그 비중이 25%였던 것이 2020년이 되면 43%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원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경제력의 집중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제9장 Artificial Struggle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기계와 인간의 對峙(대치)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AI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그 유용성의 기준은 그 기술이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가 아닌 사람들, 구체적으로 노동자, 시민들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하는 평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컴퓨터의 지능과 같이 측정되는 IQ측정은 인간의 知性(지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새로운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능을 가졌지만 인간관계와 용인술에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다시금,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제11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의 주제는 어떻게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페이스 북과 같은 빅테크들을 통제하고 중산층, 노동자들이 이들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데 구체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각종 시민단체와 같은 풀뿌리 조직들의 재건이 그 한 방향이고 다른 한편, 정부의 규제로서 빅테크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관련 입법, 세제 강화, 그 밖에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재 광고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세 후반부 원유와 그 정제사업, 철강, 철도, 화학 등에서 압도적인 독점자본들의 횡포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뉴딜 정책을 입안한 계기가 되고 전후의 부흥과 풍요를 가져온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카모토 타카시의 中國近代史중국근대사 (2) | 2023.09.30 |
|---|---|
| 문자의 왕국 Kingdom of Characters (2) | 2023.09.24 |
| 칩워Chip War (0) | 2023.09.12 |
| 아시아의 힘 (0) | 2023.09.06 |
| 인구대역전人口大逆轉-인플레이션 시대가 온다 (0) | 2023.08.31 |



